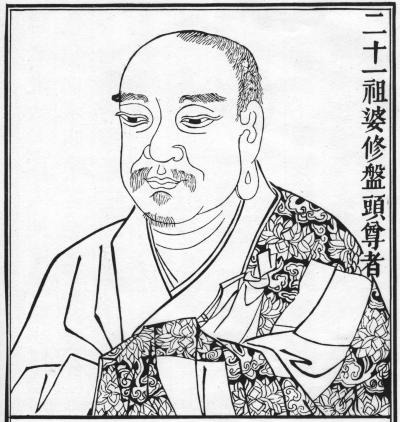백과사전 상세 본문
개요
불교는 인도종교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브라만 또는 비아리안적인 관념들을 토대로 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이전 BC 6세기경에는 아트만·카르마·목샤(해탈)라는 브라만적인 이론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푸라나 카샤파류의 자연주의자, 아지비카 즉 마칼리 고샬라류의 결정론자, 아지타 케사캄발린류의 물질주의자, 자기훈련의 고행과 업의 효용성을 믿었던 니간타 나타푸타, 회의주의자인 산자야 베탈리푸타 등이 반대의 대표자들이었다.
불교·자이나교·아지비카는 모두 브라마나의 제식주의적 다신론, 〈우파니샤드〉의 일원론적 신비주의를 함께 부정했다. 이들 모두는 우주 속에 있는 자연법의 지배를 인정했다. 불교는 아트만이라는 근본개념은 거부했으나, 카르마와 해탈이라는 베다적 관념은 간직했다.
4성제와 8정도
석가모니는 고집멸도(苦集滅道)와 8정도를 가르쳤다.
비록 두카(duḥkha)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의미하지만 고타마의 용법은 고와 낙, 행복과 고통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고에는 일상적인 고, 무상고, 오온성고(五蘊盛苦)의 3가지가 있다. 한마디로 무상한 것, 무엇이든 인과율에 종속되는 것은 고인데 이것이 인간의 상황이다. 고의 본성을 아는 자는 그 원인도 안다. 고의 원인을 갈애와 무명에서 찾고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12연기설이다.
석가모니는 쾌락과 고행의 삶을 부정하고 중도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8정도로 이루어졌다.
무아의 관념과 열반
초기불교의 중요한 2가지 개념은 무아(anātman)와 열반(nirvāṇa)이다.
석가모니는 무아의 도리를 이론이 아니라 사물의 여실한 모습에 대한 현상학적인 기술로 제시했다. 유랑승 바차고타와의 대화 가운데 석가모니는 상주론(śāśvatavāda)과 단멸론(ucchedavāda)을 거부했다. 상주론은 무아와 합치하지 않으며, 단멸론은 존재하지도 않는 자아를 가졌을 때만 의미가 있다. 어떤 형이상학자에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으로부터 의식의 흐름속에 '내가 있다'라는 의식이 스스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석가모니는 기술하고 있다.
무아론은 푸드갈라라는 개인적 인격과 담마스라는 존재요소에 각각 적용되는 2가지 면을 갖고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개인은 5온으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후자의 측면에서는 모든 요소들의 절대 비실재성을 의미한다. 전자의 진리에 대한 직관적 통찰로 정염과 욕망이 사라지며, 후자의 진리에 대한 통찰로 사물 일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한다. 전자는 번뇌장(煩惱障 kleśāvaraṇa)을, 후자는 소지장(所知障 jñey-āvaraṇa)을 제거하면서 마침내 열반으로 이끈다.
초기 경전에는 열반에 대한 긍정적 설명과 부정적 설명이 함께 보인다. 열반이란 극단적인 지멸(止滅)의 상태이지만, 생존의 지멸이 아니라 정염과 고통의 지멸이다. 이는 인과계열의 초월이며, 자유와 자발성, 희열의 상태이다. 열반은 그러나 어떤 과정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또하나의 멸망하는 상태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불멸의 실체는 아니다. 이 진리는 극단적인 무아, 사물의 무상, 자아의 공, 모든 사물의 무상에 대한 진리이다. 이 진리의 깨달음과 함께 무명은 없어지고, 모든 갈애·고·증오는 함께 사라진다(→ 불교).
대승불교 : 용수와 공(空)의 철학
대승불교의 시초는 비록 대중부(大衆部)·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경량부(經量部) 등의 여러 부파이지만, 철학적 토대를 부여한 자는 용수(龍樹 Nāgārjuna)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도 공이며 법도 공이다. 그는 공(śūnyatā)의 개념을 확장해서 모든 개념과 실체를 포괄했다. '공'이란 연기론에로의 종속과 무자성(無自性)을 의미한다. 용수는 공의 도리로 제한된 것과 무제한의 것, 주관과 객관,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윤회와 열반 사이에 존재하는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존재론적 일원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제와 속제라는 2개의 진리질서를 주장하면서 인식론적인 이원론을 지지했다. 유일의 실재는 불가설(不可設)이다. 용수는 철학자들이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주요철학범주들을 비판하고 이들 모두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관계, 부분적 동일성과 차이성, 인과, 변화, 자아, 지식, 보편자, 그리고 적당한 지식수단(pramaṇā)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용수의 철학은 중관철학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중도를 따른다는 의미인데, 중도란 '실재는 영원하다'는 주장과 '실재는 변화한다'와 같은 상반된 두 주장의 종합이 아니라, 두 주장 모두가 공이며 오류임을 보이는 데 있다. '실재는 영원하기도 하며 변화하기도 한다'는 주장은 또하나의 형이상학적 언명이며, '실제는 영원하지도 변화하지도 않는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전자보다는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형이상학적 견해(dṛṣṭi)에 불과하다.
용수에게는 일체의 형이상학적 견해는 잘못이다. 용수는 이성의 비판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했다. 논리의 용법을 이처럼 프라상가로 알려진 부정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에 국한시킨 그의 제자들은 귀류논증파(歸謬論證派 prāsaṅgika)로 알려졌으며, 성천(聖天 Āryadeva)·불호(佛護)·월칭(月稱 Candrakῑrti)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청변(淸弁) 등은 직접적 논증의 방법을 따르며, 자재논증파(自在論證派)로 불린다.
용수와 더불어 불교논리학은 자신의 특성을 확립하고, 그무렵 유식학파가 중관학파에서 분리되어 나간다.
세친·무착
형 무착(無着 Asaṅga)에 의해서 유식으로 돌아선 세친(世親 Vasubandhu)은 〈유식론 Vijñāpti mātrāta Siddhi〉을 저술하여 이른바 외적 대상은 단지 정신적 관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옹호했다.
유식학파의 관념론은 경량부의 표상론의 논리적 발전이다. 외계의 존재가 단지 추론되었다는 생각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의식이 자기조명적(svaprakāsa)이고 형상을 지닌다면, 이른바 외적 대상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형상을 의식의 형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또하나의 다른 관념, 즉 의식이 형상을 취하고 이를 외화(外化)하려는 경향성을 설명해주는 무시(無始)의 힘이란 관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kalpanā)이다. 유식은 전통적인 6식(六識)에 말라식(末那識 manas)과 장식(藏識 ālaya-vijñāna)이라는 의식양상을 부가한 것이다. 장식은 청결하고 불결한 과거경험의 종자를 간직하고 있다.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초기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의식양상들은 개인적 경험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구조물이다.
그렇지만 일상적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유식파의 주요난제로 남아 있다. 열반의 상태는 장식이 그 종자와 함께 없어지는 상태(ālayaparāvṛtti)인 것이다. 개인적 관념들은 결국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며, 의식은 그 본성상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다. 이 불가설의 의식이 만물의 근본이 되는 여시(如始 tathatā)이다.
장식도 여시도 실체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세친과 무착은 불교논리학의 발전에도 책임이 있다. 세친은 '지각'을 대상에 의해서 야기된 지식으로 정의했으나 이것은 5세기의 논리학자 진나에 의해서 세친 초기의 실재론적 시기에 속한 것으로 거부당했다. 세친은 또한 추론을 특성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8세기의 다르마못타라는 이것이 추론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것의 생성기원일 따름이라고 했다.
진나·법칭
진나(陳那 Dignāga)의 〈양집성론(量集成論) Pramāṇasamuccaya〉은 불교논리학의 가장 위대한 저서 중의 하나이다.
진나는 지각을 '이름이나 류(類)개념을 포함한 모든 개념적 구성물에서 자유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그에게는 순수지각만이 지각이다. 추론에서는 그는 위자비량(爲自比量)·위타비량(爲他比量)으로 나누고, 정당한 증인(證因 hetu)의 3조건을 제시했다. 주장의 주제(pakṣa)에 대한 속성일 것, 동례군(同例群 sapakṣa)에만 존재할 것, 이례군(異例群 vipakṣa)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 그것들이다.
진나는 그의 〈헤투 차크라〉('因의 輪')에서 증인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올바른 이유(正因), 잘못된 이유(相違似因), 진위부정의 이유(不正似因)로 분류했다. 진나의 전통은 7세기의 법칭(法稱 Dharmakῑrti)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는데, 법칭은 지각에 대한 진나의 정의를 수정하여 '무착란'(abrānta)이라는 규정을 첨가했다. 그리고 〈정리일적(正理一滴) Nyāyabindu〉에서 지각을 감관지, 마음에 의한 지각(manovijñana), 자증지(自證知), 요긴에 의한 지각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법칭은 또한 타당한 추리근거로서 본질적 속성(syabhāva), 결과(kārya), 비인식(anupalabdhi)의 3가지를 제시했다. 법칭은, 지각의 대상은 순수개별자, 추론의 대상은 보편자라는 사실을 불교인식론의 중심적 이론으로 확립했다. 진나와 법칭은 완화된 형태의 관념론을 대변하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레이어
[Daum백과] 철학으로서의 인도 불교 – 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