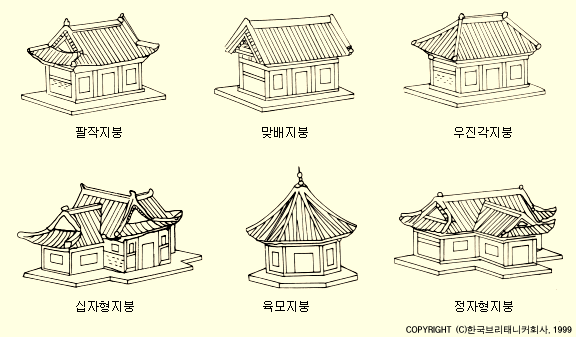백과사전 상세 본문
한국에서는 선사시대 움집[竪穴住居]에서부터 지붕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움집은 땅을 파고 평면의 가장자리에 서까래를 경사지게 꽂아 중앙의 한 점으로 모이게 한 후, 서까래들을 기본으로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지붕을 형성하여 비와 바람을 막았다. 따라서 인공적인 벽체는 아직 없었으며, 지상에 드러난 구조물은 모두 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의 형태는 평면 구성에 따라 원형 평면인 경우에는 원추형, 방형 평면인 경우에는 맞배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시적인 지붕 형태에서 벗어나 언제부터 발전된 형태의 지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삼국시대 건축지에서 출토된 와당편·기와편·고분벽화·가형토기 등 실질적인 자료와 고문헌의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에는 이미 완전한 지붕구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의 건축, 한국의 주택).
〈구당서 舊唐書〉에 의하면 불교가 전래된 372년 이후의 고구려 민가는 초가지붕이고, 궁궐·관아·절 등은 기와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쌍영총과 동수묘의 벽화에 맞배지붕을 한 건물이 그려져 있고, 안성동 대총 전실의 누각도(樓閣圖)에 우진각지붕의 건물이 그려져 있어 이 시기의 지붕 형태를 알 수 있다. 백제의 지붕은 산경문전에 표현된 팔작지붕의 집, 부여에서 출토된 동탑편은 비록 한 층만 남아 있지만 일본 호류 사[法隆寺]의 5층탑과 같이 사모지붕을 하고 있고, 많은 와당류가 발견되어 그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신라와 통일신라의 지붕은 〈삼국사기 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에 진골계급부터 막새기와[唐瓦]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계급에 따라 기와지붕의 모양새를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헌강왕조에는 "孤聞今之民間覆屋以瓦不以茅"라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시대 경주의 민가에는 기와지붕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가형토기를 보면 팔작지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삼국시대에 이미 한국 지붕의 틀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는 봉정사 극락전(맞배지붕), 수덕사 대웅전(맞배지붕), 부석사 무량수전(팔작지붕) 등의 목조건물이 현존하고 있어 지붕의 형태를 알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현존하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어 다양한 지붕 형태를 고찰해볼 수 있다.
한국의 지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짚으로 이엉을 엮은 초가지붕, 얇고 편편한 돌조각으로 된 돌기와지붕, 두꺼운 널조각으로 된 너와지붕, 참나무 나무껍질 등으로 엮은 굴피지붕, 기와를 사용한 기와지붕 등으로 나누어진다.
초가지붕은 농촌이나 서울의 대부분 서민들 주택에서 볼 수 있었으며, 너와지붕과 굴피지붕은 산간지방에 위치한 화전민의 주택에 많았다.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우진각지붕·팔작지붕·사모지붕·육모지붕·팔모지붕 등 다양하다. 맞배지붕은 집체를 사이에 두고 지붕의 양면을 경사지게 한 것으로, 측면에 3각형으로 된 박공이 형성되므로 박공지붕이라고도 하며 선사시대의 움집이 맞배지붕이었던 것으로 보아 기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배지붕은 사찰의 주요전각과 승방·천왕문, 궁궐의 행방, 상류주택의 행랑채와 서민주택의 몸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초의 주심포계 건물은 대부분 맞배지붕이었다. 특히 맞배지붕은 박공 부분의 구조체가 노출되므로 아름다운 목조가구(木造架構)의 구조미를 볼 수 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풍판을 달아 박공 부분을 가리게 됨으로써 구조미가 감소되었다.
우진각지붕은 용마루를 형성하면서 4면(四面)으로 지붕면을 형성한 것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인 안성동 대총 전실 남벽 누각도에 우진각지붕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그 역사가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성의 성문, 궁궐의 대문, 사찰의 일부 건물이나 상류주택의 일각대문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존하는 예로는 서울 남대문, 창덕궁 돈화문, 창경궁 홍화문, 수원 팔달문 등이 있다.
팔작지붕은 지붕면이 4면으로 되어 있는 점은 우진각지붕과 같으나 양 측면에 합각(合閣)이라 부르는 3각형 부분이 있어 추녀마루가 용마루선까지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합각부에서 1번 끊기게 된 점이 다르다.
이 합각부는 건물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무늬로 장식되는데, 담장 등의 재료나 무늬를 반복·사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했다. 팔작지붕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주심포계 건물에 사용된 경우도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주로 다포계 건물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중류·상류 주택의 안채와 사랑채, 사찰의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전각, 궁궐의 정전(正殿)을 비롯한 주요한 대소전각, 서원과 향교 등 많은 건물에 팔작지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사모지붕(네모지붕)·육모지붕·팔모지붕은 모두 용마루를 형성하지 않고, 추녀마루가 지붕의 중심에 모이게 되므로 모임지붕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임지붕은 주로 정자건축에 사용되었으며, 지붕은 정자의 평면과 같은 형태이다.
예를 들어 창덕궁 연경당의 농수정(濃繡亭)은 평면이 4각형으로 사모지붕이며, 경복궁의 향원정(香園亭)은 평면이 6각형으로 육모지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들 모임지붕은 지붕의 중앙에 추녀마루가 모여들기 때문에 절병통(탑 모양의 장식)을 얹어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 이밖에 건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지붕을 구성한 정(丁)자형지붕과 십(十)자형지붕 등이 있다. 왕릉의 정자각(丁字閣)에서 볼 수 있는 정자형지붕은 맞배지붕이 모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주변보다 지붕을 높게 구성한 것을 솟을지붕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지붕의 장식에는 모임지붕에 절병통을 사용한 것 이외에 추녀마루 끝에는 잡상(雜像)을 늘어놓고, 용마루 끝이나 합각머리에는 용두(龍頭)나 취두(鷲頭)를 얹어 장식했는데 이러한 장식은 궁궐의 전각, 도성의 성문, 궁궐의 대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식은 지붕의 격을 한층 더 높여주고, 건물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더해준다.
한국의 지붕은 평면상으로는 후림을 두고, 용마루선과 처마선의 중앙부를 약간 처져 보이게 한 반면에 추녀에는 조로를 두어 치솟게 한다.
이것은 귀기둥의 귀솟음이나 안쏠림수법과 함께 용마루선과 처마선을 수평선으로 평행하게 하는 경우 가운데가 약간 처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양의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수평선의 중앙부를 약간 들리게 한 것과는 반대이다. 따라서 조로·후림·귀솟음은 육중한 지붕이 건물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반감시켜 건물에 경쾌감과 선적인 아름다움을 준다. 이와 같은 지붕의 유연한 선적(線的) 구성은 대부분의 산봉우리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노년기의 산지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연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지붕의 또다른 특징은 서까래의 배열이다. 즉 한국건축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의 경우 모서리 부분의 서까래 배열을 마치 부채살이 펴진 모양의 선자(扇子)서까래로 하고 있어 일본건축이 지붕 모서리에서 추녀만을 대각선으로 놓고 서까래는 처마에 직각으로 배열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선자서까래는 건물에 강한 연속성과 율동적인 아름다움을 준다. 특히 모임지붕의 경우에 선자서까래는 더욱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추녀의 곡선·귀솟음·후림·조로와 더불어 한층 더 건물에 경쾌함과 율동감을 준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